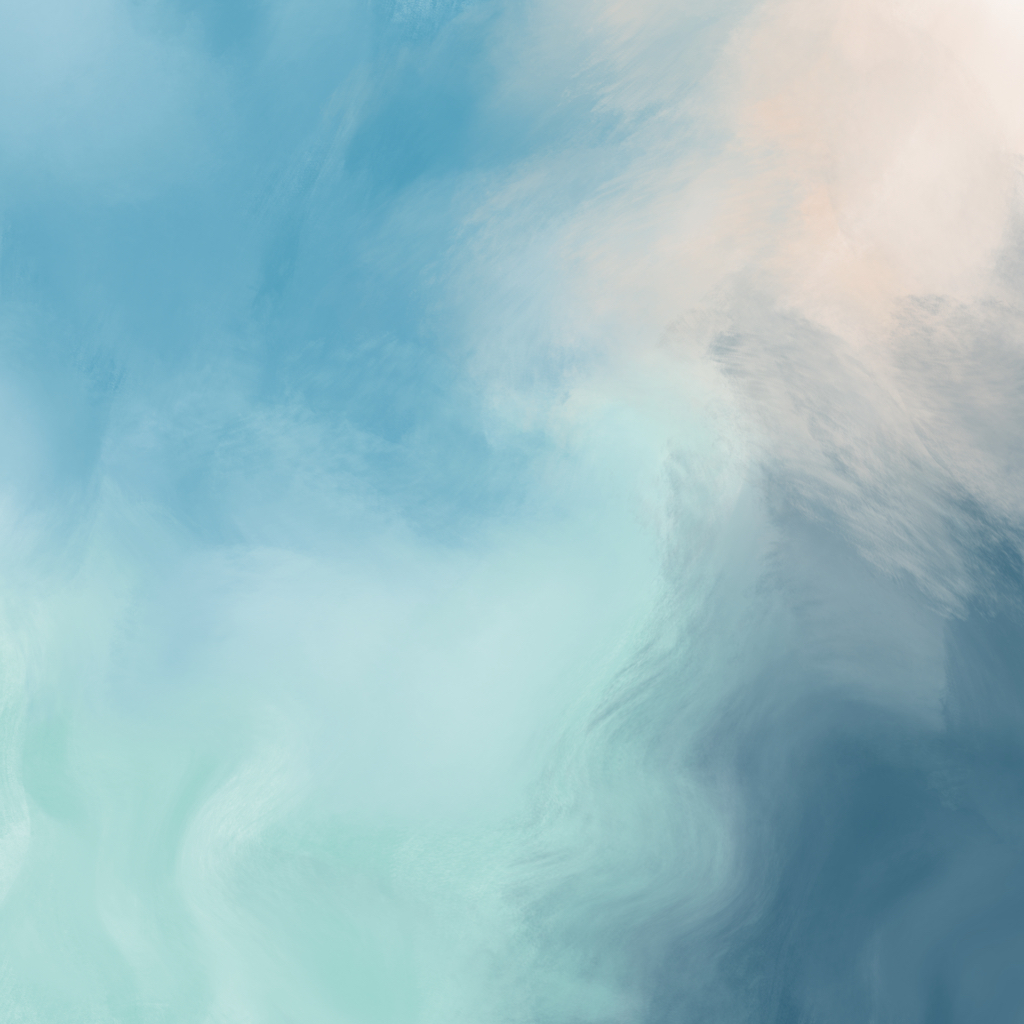티스토리 뷰
일상 속 경제이야기7 : ‘명품 중고시장’은 왜 커지는가?
명품의 가치는 가격이 아니라 ‘희소성’에서 나온다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등 하이엔드 브랜드의 가격이 매년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제품 품질을 넘어선 ‘희소성(scarcity)’이라는 강력한 경제학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전경제학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결정되지만, 베블런재(Veblen goods) 개념에 따르면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이는 상품의 가격 자체가 소비자의 ‘과시 욕구’를 만족시키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 토르스테인 베블런은《유한계급론(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에서, “상류층은 소비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며, 이러한 행위는 희소한 재화에서 특히 두드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명품은 단지 소비재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한정판 전략과 인위적 공급 제한
명품 브랜드는 전통적으로 공급을 제한하는 전략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유지합니다. 특히 에르메스의 버킨백이나 샤넬의 클래식 플랩백은 매장에서 쉽게 구할 수 없도록 조절된 ‘공급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전략은 ‘희소성’을 만들어 내고, 시장에선 도리어 리셀가격이 정가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낳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HBS)의 경제학 교수 John Quelch는 “희소성을 자산화하면 브랜드는 정가 이상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으며, 이는 리셀 시장이 작동하는 핵심 논리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StockX, The RealReal, KREAM(한국) 등 리셀 플랫폼의 성장률은 연평균 20% 이상이며, 글로벌 리셀 시장은 2030년까지 약 82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Statista, 2023).
명품을 ‘투자자산’으로 보는 세대의 변화
MZ세대는 명품을 단순한 소비가 아닌 ‘자산’ 혹은 ‘투자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물가상승, 금리 인하, 전통 투자처의 불안정성 속에서, 한정판 명품이 실물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맥킨지(McKinsey)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Z세대와 밀레니얼 소비자의 34%는 “명품을 구매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가치 상승을 기대해서”라고 답했으며, 20%는 “추후 되팔 것을 염두에 두고 산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환으로 명품을 고려하는 소비자 집단이 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디플레이션에 강한 실물 희소 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리셀 시장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리셀 시장의 정착, 그리고 새로운 경제 질서
과거엔 벼룩시장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리셀 시장이, 이제는 정식 유통 채널만큼 합법적이고 투명한 거래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가보다 높은 프리미엄에도 상품이 거래되고, 전문 감정 및 인증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신뢰 기반의 2차 시장 경제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경제학적으로 ‘2차 시장(secondary market)의 효율성’이라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일정 기간 사용한 후에도 잔존 가치가 유지되고, 다시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구조는 자원 낭비를 줄이고 시장 전체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한편, 브랜드 측에서도 리셀 시장을 전략적으로 받아들이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구찌와 버버리는 자사 공식 리셀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협업을 통해 중고 명품 판매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명품 리셀은 단순한 소비 문화가 아니라, 새로운 소비 생태계의 일부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일상 속 경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일상 속 경제이야기11 : 인맥 관리와 정보의 가치 (0) | 2025.05.07 |
|---|---|
| 일상 속 경제이야기10 : 타인의 SNS는 왜 부러움을 유발하는가? (2) | 2025.05.07 |
| 일상 속 경제이야기9 : 왜 사람들은 ‘공짜 술자리’에 더 자주 나갈까? (0) | 2025.05.06 |
| 일상 속 경제이야기8 : 온라인 쇼핑은 진짜 효율적인가? (0) | 2025.05.06 |
| 일상 속 경제이야기6 : 게임이론으로 이해하는 ‘노쇼(No-show)’ 이야기 (0) | 2025.05.05 |
| 일상 속 경제이야기5 :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왜 충동구매율이 높아질까? (0) | 2025.05.04 |
| 일상 속 경제이야기4 : 신용카드의 혜택, 진짜 이득일까? (2) | 2025.05.04 |
| 일상 속 경제이야기3 : 우리가 ‘무료배송’에 끌리는 이유 (0) | 2025.04.14 |